‘뷰티쇼’라는 이상한 세계
뷰티쇼를 보면서 궁금해졌다. 이 말은 왜, 어디서 왔을까? 억지로 만든 신조어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뷰티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를 훔치고 있었다. 뷰티쇼를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나도 <겟잇뷰티>를 위시한 여러 뷰티 전문 프로그램의 충실한 시청자다. ‘겟잇뷰티’를 호처럼 달고 사는 것 같은 뷰티 에디터 황민영이 특별 출연한 수지가 발라준 빨간 립틴트를 바르고 수줍게 웃을 땐 내일 놀릴 거리를 찾아서 좋아 죽겠고, 집에서 눈썹을 다듬고 그리는 법을 알려줄 땐 여동생과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뚫어질 듯 보곤 바로 실습에 들어가기도 한다. <얼루어>의 에디터라고 해도 누가 내 눈썹을 뽑고 다듬고 그리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진 않으니까. 한동안 이 뷰티 전문 프로그램은 꽤 영리한 뷰티 과외선생님 같았다. 하지만 이 뷰티 전문 프로그램이 요즘은 조금 지루해졌다. 물광, 꿀광, 윤광, 결광, 자연광 메이크업 같은 것들이 그렇다. 도대체 이 광의 차이가 있긴 한가?
한때 이상한 조어들로 희화된 패션 프로그램처럼 뷰티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광인지 알 수 없는 ‘광’처럼, 어떤 감인지 알 수 없는 ‘감’도 있다. 홍시를 넣으면 홍시 맛이 나고 사과를 넣으면 사과 맛이 난다. 어떤 색이든 바르면 분명 그 색인데 자꾸 ‘감’이라고 이야기한다. 펄을 바르면 펄감, 오렌지를 바르면 오렌지감, 그린을 바르면 그린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컬러 팔레트만큼이나 다양하고 펄까지 자르르한 감이 열린 감나무가 떠오른다. ‘감’이라는 건 느낌이라는 것인데, 오렌지감은 계속 이것이 오렌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느 낌적 느낌’을 만들어 낸다. 메이크업을 시연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권법도 이제는 너무 많아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기 앉으실게요”, “스테이크 나오셨습니다”라는 서비스 용어만큼이나 괴이한 말들이 귀에서 덜컹거리기 시작하자, 이 ‘뷰티쇼 용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뷰티 신조어가 미치는 영향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뷰티 전문 프로그램은 수많은 뷰티 신조어를 양산해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 과거에 등장한 말들이 자연발생적이라면 지금 생기는 말들은 뷰티 마케팅이 주도하는 주입식 교육인 경우가 더 많다. 원래 뷰티 신조어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뷰티 구루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다. 뷰티 프로그램은 그 단어들을 길어 올려 퍼뜨렸다. 그중에는 뷰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용어가 된 것도 있다. ‘저렴이’가 그렇다. 저렴하다는 건 값싼 제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값싼 제품을 ‘저렴이’로 부르기 시작하자, 그것은 내게로 와서 어쩐지 귀여운 구석이 있고 실속 있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 같은 합리적인 제품이 되었다. 게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와인 업계의 전설인 ‘파리의 심판’처럼 원래 블라인드 테스트는 주류보다 비주류가 얻을 게 많은 법이다). 작년과 올해 로드숍 화장품의 비약할 만한 성장에는 바로 이 ‘저렴이’ 열풍이 한몫했다. 한때 모든 여자가 거울 앞에서 샤넬 팩트를 두드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브랜드의 팩트를 꺼내도 상관없어졌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 “어머, 이게 그 ‘저렴이 팩트’야? 나 한번 발라봐도 되겠니?” 한편 이 ‘저렴이’의 흥행은 ‘고렴이’라는 ‘망작’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저렴이와 다른 고가의 럭셔리 화장품이라는 의미의 ‘고렴이’는 아마도 값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제품이라는 뜻을 담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렴하다’의 ‘렴(廉)’은 청렴하다, 검소하다라는 뜻의 한자다. 그러므로 ‘고렴이’라는 말은 더없이 괴상하다. 프로그램도 그것을 알았는지 몇 번 사용한 후로는 안쓰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요즘의 뷰티쇼 신조어는 새로운 트렌드나 신제품과 함께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인강’ 같기도 하다. 그런 의심을 갖게 한 온갖 ‘광’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건 ‘촉광’이었다. 이 ‘촉광’은 유난히 촉촉한 팩트와 늘 함께다. ‘촉광’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학 용어로 ‘빛의 강약을 재는 단위’지만 물론 그것이 아니라 ‘촉촉한 광’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물론 이 ‘촉광’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감이 좋지 않아서 광 중에서 가장 흥행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뷰티쇼에서는 올해 마지막의 최대 유행이라는 ‘자연광 메이크업’이 나왔다. 차근차근 완성된 메이크업은 딱 따라 하고 싶은 그것이었고, 어떤 제품이 쓰였는지 맹렬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당장 내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궁금증은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첫 광고에 그 메이크업에 사용된 제품의 대부분이, 바로 같은 설명을 달고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60분짜리 광고를 본 것은 아닐까. 정말 이번 시즌 뷰티 트렌드는 ‘자연광’일까?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전략 제품이 ‘자연광’일까? 이제는 모든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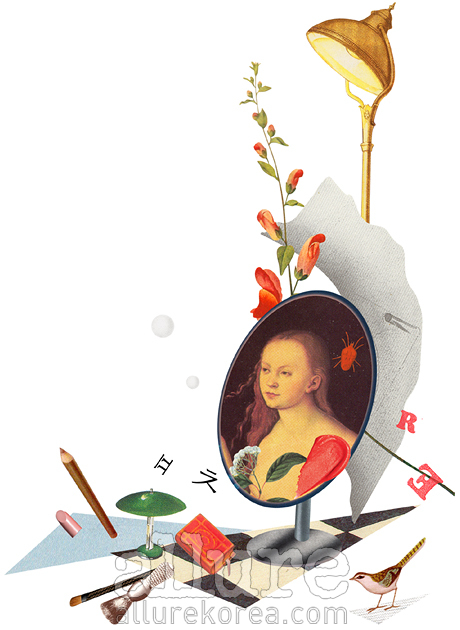
내 별명을 불러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난히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는 건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빨리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뷰티 마케터들의 ‘별명 짓기’ 수완일 때가 많다. 한 달 동안 출시된 모든 신제품을 소개하는 <얼루어>의 ‘It’s on Sale’의 기사처럼, 수많은 브랜드는 신제품을 쏟아낸다. 그만큼 많은 뷰티 제품이 존재한다. 이 제품들이 ‘대박’을 치기 위해선 소비자의 머릿속을 파고들어야 한다. 특히 영어와 프랑스어가 대부분인 수입 제품의 이름은 어렵다. 그 과정에서 인기 제품은 자연스럽게 별명이 생겼다. 십 년 전부터 있었던 ‘금색통 크림’처럼 말이다. “면세점에서 금색 통에 든 그 크림 사와!”. ‘리뉴트리브’라는 이름에 비해 ‘금색통 크림’이 아빠들에게 쉬울 거라는 걸, 엄마들은 알았다. 금색통은 때로 옛날 동동구리무처럼 귀엽게 들리기까지 했고 아빠들은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에스티 로더의 크림을 들고 금의환향할 수 있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에스티 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는 그냥 ‘갈색병’, 클라란스의 ‘하이드라 퀀치 인텐시브 세럼’은 ‘파란 에센스’가 되었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짐승젤’을 키웠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좋아해서 스스로 만들고 부른 애칭이다. 브랜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발 빠르게 광고와 마케팅에 이 애칭을 적극 사용하면서 영향력을 넓힘으로써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별명은 곧 위대한 성공을 보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해 별명을 지어주기를 기다리는 건 더딜 뿐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뷰티 마케터들은 방송, 잡지, 온라인과 SNS를 총동원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기 바쁜 것이다. 여전히 극히 일부만 성공할 뿐이지만 말이다. 점점 신기한 조어가 많아지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그 메이크업이 그 메이크업 같은 건 뷰티 프로그램의 소재 고갈 탓도 있다. 처음 뷰티 전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결혼을 하거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잔뜩 구매한 후에 받는 메이크업 쿠폰이 아니면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없는 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뷰티 레슨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꼼꼼한 세안법이나 눈썹 손질법, 집에서 네일 아트를 하는 법, 머리에 볼륨을 넣거나 웨이브를 넣는 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전수해줬다. 그러나 시즌을 거듭하면서 점점 소재가 고갈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데이트’, ‘여름 휴가’, ‘청순’, ‘동안’ 등 다양한 코드 네임을 달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신제품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셀러브리티의 뷰티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 셀러브리티가 모델인 브랜드 제품으로 도배를 하고, 해외 촬영을 가면 또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이 장시간 노출된다. 프로그램이 점점 마케팅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뷰티 프로그램은 전화번호만 없는 홈쇼핑이 되기도 하고 또 기껏 변신을 시켰는데 변신 전이 더 낫더라는 실소를 자아내기도 한다(프로그램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항의다). 뷰티 전문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의 ‘성공 모델’이다. 그리고 그 성공 모델이 ‘수익 모델’을 의미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뷰티 프로그램이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원하는 진짜 도움이 빠진 제품시연은 아무리 신조어를 등에 업어도 흥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뷰티 프로그램에 청함
뷰티 프로그램은 더 예뻐지는 것으로 자존감과 경쟁력을 획득 하려는 여자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뷰티 산업이 미디어에서 만난 접점이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제품이 사실상 ‘유가’이며 한 회 메인 제품으로 등장하는 대가로 몇 천부터 억대의 돈이 오간다는 언론의 폭로는 별다른 반향 없이 끝났다. 서로 알고 보는 ‘쇼’라는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브랜드는 제품을 알려야 하며, 그 사이에서 방송사는 돈을 번다. 그러니 방송을 보면서 귀에 쏙쏙 꽂히는 말에 큰 의미를 두는 것부터가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메이크업으로 만드는 ‘광’ 말고, 노메이크업 처럼 보이는 풀메이크업 말고, 정말 노메이크업으로 활보할 수 있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은 왜 잘 알려주지 않는 걸까? 노메이크업으로도 당신은 예쁘다고 왜 말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사면 그대로 낭비인 제품은 없을까? 카피 제품의 속은 과연 똑같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
최신기사
- 에디터
- 피처 에디터 / 허윤선
- 아트 디자이너
- IIllustration | Heo Jeong E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