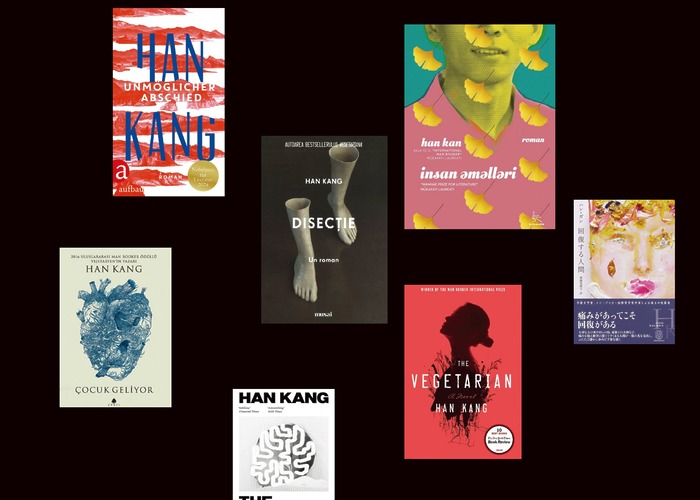그 작가의 새 작품, 마지막 작품
이십여 년간 변함없이 동시대와 호흡하는 작가 폴 오스터의 신작 <디어 존, 디어 폴>과 <내면보고서>. <디어 존, 디어 폴>은 폴 오스터가 200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J.M. 쿳시와 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수록한 서한집이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79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제는 문학과 영화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역할, 금융 위기,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처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쿳시였다.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학 축제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쿳시의 제안으로 ‘펜팔 친구’가 된다. 이들은 이메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고전적인 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것이 ‘편지’라는 형식에 더 어울린다고 여겼던 것일까? 작가들은 작품에서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친애하는 존, 소설가들은 이런 발명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동시대의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서로에 대해 정보가 없다는 건, 소설의 이야기를 짓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왔지만, 이제 독자들이 “왜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서 말하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해진 시대. 21세기 소설가들의 직업적 고충을 보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내면 보고서>는 작가의 추억에 더 바짝 다가선다. 초기작 <빵 굽는 타자기>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가난한 뉴요커의 삶을 숨김없이 표현했던 그가 자신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한 단상을 적어 내렸다. 가족,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 등 다양한 추억을 시간순이 아닌 떠오르는 대로 적었다. 폴 오스터와 그의 작품을 사랑해왔다면, 그의 진실한 삶이 담긴 이 두 권의 책이 마음에 들 것이다. <충분하다>는 폴란드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유고 시집이다. 생전에 출간한 마지막 시집 <여기>와 사후에 출간된 <충분하다>를 함께 엮었다. 시인은 <여기>를 출간한 2009년, 다음 시집의 제목을 <충분하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히 고령이었던 시인은 이미 죽음이라는 주제를 시 안에서 고민했던 것 같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이라는 시에서는 죽음에 대해 ‘조만간 누구에게나 닥치게 될 낮이나 저녁, 밤 또는 새벽의 일과라는 걸’이라고 적었다. 시인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은 작가의 말을 따라 시집의 제목을 <충분하다>라고 지었다. 왜 ‘충분하다’라고 지었는지, 무엇이 충분한 것인지 물어볼 시인은 이제 없다. 특히 시집 뒷부분에 실린 ‘마지막 시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길. 작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원고와 메모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미완성이나 그 자체로 ‘충분한’ 글들. “나는 참으로 길고, 행복하고, 흥미로운 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운명에 감사하며,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화해를 청합니다.” 작가가 남긴 말이다.
- 에디터
- 허윤선
- 포토그래퍼
- 심규보